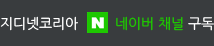실리콘밸리의 유력 IT업체들은 왜 뉴스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까?
페이스북, 애플, 구글의 공통점은?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기업들이다. 모바일 플랫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공통 변수다.
여기에 최근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추가됐다. 셋 모두 언론사와 손을 잡고 모바일 뉴스 최적화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궁금증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은 왜 경쟁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선보이는 걸까? 언론사들의 고유 영역까지 넘보려는 걸까?

■ 페북 "언론사 페이지 로딩속도 느려 독자 불편"
페이스북 등이 뉴스 서비스를 할 때 내세운 명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들이 뉴스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 이탈 방지’를 꼽을 수 있다. 페이스북 등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뉴스 때문에 자칫하면 이용자들이 이탈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페이스북부터 한번 살펴보자.

페이스북은 지난 5월 뉴욕타임스, 버즈피드를 비롯한 유력 언론사들과 손잡고 ‘인스턴트 아티클’이란 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구동되는 ‘인스턴트 아티클’을 선보이면서 페이스북이 강조한 것은 ‘로딩 속도’였다.
최대 8초에 이르는 언론사 사이트의 로딩 속도 때문에 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서 구동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스턴트 아티클 서비스를 시작하는 명분이었다.
■ 애플, 검색 기능 강화로 앱 이용 쉽게 만들어
그런 점에선 애플도 마찬가지다. iOS9부터 제공될 ‘애플 뉴스’ 앱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50개 언론사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애플의 뉴스 독자 잡기 정책은 단순히 뉴스 앱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iOS9부터 검색 API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능이 본격 적용될 경우 앱을 일일이 열지 않고도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검색창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당연한 얘기지만 뉴스 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니먼랩이 두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첫 번째는 모바일 기기에서 검색을 하면 관련 뉴스가 바로 뜬다는 것. 이를테면 ‘메르스’를 검색할 경우 메르스 관련 뉴스들을 바로 모아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검색어와 연계한 뉴스 소비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니먼랩의 두 번째 분석이 더 흥미롭다.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검색 화면 하단에 뉴스가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애플이 정확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뉴스가 뜨는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기능이 구현될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뉴스 소비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페이스북과 애플의 속내는 뉴스 수용자들을 자신들의 앱 생태계 내에 잡아두겠다는 것이다. 링크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대신 자기 내 정원 안에서 놀도록 하겠다는 게 두 회사의 공통점이다.
■ 구글, 앱 생태계 공세에 위협 느낀 듯
그렇다면 구글은 왜 뉴스 서비스를 하려는 걸까? 일단 문제의식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뉴스를 눌렀을 때 바로 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구글이 뒤늦게 ‘모바일 뉴스 최적화’ 사업에 뛰어든 건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뉴욕타임스가 잘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이 ‘모바일 뉴스 최적화’를 꾀하는 것은 페이스북, 애플 같은 폐쇄된 생태계의 공세로부터 웹을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검색 전문 사이트인 서치엔진랜드 창업자인 대니 설리반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구글과 트위터는 언론사 등이 페이스북에 특화된 어떤 것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오픈 생태계인 모바일 웹에 터를 잡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웹에서 기사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적화된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API를 만든 뒤 모든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페이스북, 애플과 구글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 서로 다른 영역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 뉴스는 24시간 업데이트되는 최적의 콘텐츠
하지만 이들이 뉴스에 유독 관심을 갖는 공통 분모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뉴스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무슨 얘기인가? 뉴스는 24시간 쉴 새 없이 업데이트 되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은 세계 유력 매체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품질 수준을 좀 더 높였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같은 매체들이 24시간 쏟아내는 콘텐츠를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 잘 구비해놓을 경우 담장 안에 이용자들을 잡아놓을 가능성이 한층 많아진다.
<뉴스의 역사>로 유명한 미셸 스티븐스는 지난 해 출간한 <비욘드 뉴스(Beyond News)>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언론사이지 저널리즘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저널리즘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 요소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실리콘밸리 뉴스 전쟁…구글-트위터도 가세2015.09.14
- 뉴스시장 애플 경보…플립보드 "우린 끄떡없다"2015.09.14
- 로봇은 '인간 기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2015.09.14
- 애플 '뉴스' 앱, 참여 언론사 50개 넘었다2015.09.14
페이스북을 비롯한 세계 유력 IT 기업들의 최근 행보는 스티븐스의 진단에 힘을 실어준다. 언론사들은 갈수록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원군을 얻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건전한 저널리즘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상생’이 필수요소일 것이다. ‘상생’이란 키워드는 뉴스 서비스를 준비 중인 유력 IT 기업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인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