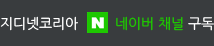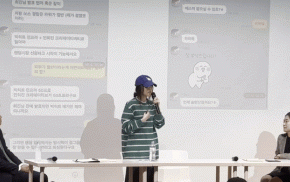작고한 농구 스타 김현준 씨의 현역 시절 별명은 ‘전자슈터’였다. 던지는 족족 들어가는 슈팅 솜씨 덕분에 붙은 별명이다. 물론 ‘전자업체’ 삼성 소속 선수였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프로농구 삼성의 이상민 감독은 ‘컴퓨터 가드’였다. 실제로 '선수' 이상민의 장기는 정교하고 정확하면서도 빠른 볼 배급이었다. 흔히 한 치 오차도 없는 사람들을 '컴퓨터 같다’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다.
하지만 난 생각이 좀 다르다. 전자슈터나 컴퓨터 가드는 ‘잘못된 별명’이라고 생각한다. 선수 김현준과 이상민을 묘사하는 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알고리즘으론 측량하기 힘든 인간의 방식
김현준 씨의 장기는 ‘정확한 슛’ 못지 않게 뛰어난 응용력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상민 감독 역시 정석 플레이 못지 않게 임기 응변에 능했다. 그들은 잘 짜여진 알고리즘 같은 플레이로 최고 스타가 된 게 아니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슛을 성공하고 어시스트를 해내는 능력 덕분에 특급 선수가 됐다.
갑자기 ‘전자슈터’와 ‘컴퓨터 가드’ 운운하는 게 뜬금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응답하라 1988’의 복고바람에 빠진 것 아니냔 비아냥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난 전자 슈터나 컴퓨터 가드란 별명 속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나 알고리즘에 대한 과도한 기대. 허점 많은 사람보다는 잘 만들어진 컴퓨터가 훨씬 정확할 것이란 착각.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다. 어제 화제가 된 두 기사 때문이었다. 하나는 ‘카카오 평균 연봉 1위’ 기사였고, 또 하나는 후배들이 공들여 쓴 ‘머신러닝, 이러다 미신러닝 될라’란 기사였다.
카카오 얘기부터 해보자. 어제 카카오가 느닷없이 화제가 됐다. 평균 연봉 1억7천만원으로 국내 1위란 기사 때문이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자료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였다.

그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삼성전자, SK텔레콤보다 평균 연봉이 높았다. 그 뿐 아니었다. 일본 1위인 키엔스보다도 2천만원 가량 더 많았다.
물론 그건 ‘잘못된 계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다. 일부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수와 총액을 그냥 나눈 것이다. 해당업체에 한번쯤만 확인했더라면 쉽게 피할 수 있었을 오류였다.
‘머신러닝, 이러다 미신러닝 될라’란 기사 역시 오랜 만에 추억의 스타들을 떠올리는 데 일조했다. 그 기사는 머신러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었다. 기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게 그 기사의 골자였다. 사람들이 계속 ‘지도적 학습’을 시켜줘야만 한다는 얘기였다.
그 얘길 들으면서 국내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 한테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절대 우아한 작업이 아니다. 그건 엄청난 노가다다. 눈이 빠질 정도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인다. 우린 그 순간을 ‘매직아이’라고 부른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그 분 역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란 의미였다.
■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세계
사실 기자들의 일 중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수습기자 시절 배운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쉴새 없이 쏟아져나오는 자료 더미에 파묻힐 위험도 적지 않다. 각종 숫자나 자료의 허점에 대해 의문을 갖기 보단 제 때 빨리 빨리 처리하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단 얘기다.
기사의 (외적인) 객관성을 강조하다보면 ‘숨어 있는 더 큰 얘기’엔 눈을 감게 되는 경우도 많다.
흐름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숫자에만 파묻혀 있다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밀하게 처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래서 난 ‘전자 슈터’나 ‘컴퓨터 가드’가 칭찬이 아닌(더 정확하게는 잘못된 칭찬인) 것처럼 ‘수습 때 배운 알고리즘’대로 일을 잘 처리하는 기자 역시 꼭 칭찬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중요한 건 ‘6하원칙’이나 ‘드러난 자료’ 너머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 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젊은이가 어디서 누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했을 때, 그 팩트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은 어쩌나. 가령 살인의 순간 그 젊은이의 영혼에서 끓어오르던 격렬한 분노를 어떻게 기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진실은 오히려 그 곳에 있지 않을까.”
지금은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훈이 기자 생활을 그만두면서 했던 고백이다. 그는 저 고백 말미에 “6하를 버렸을 때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썼다.
설사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더라도, 여전히 현장을 열심히 뛰는 기자가 필요한 건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컴퓨터나 알고리즘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있는 세상을 읽어내는 일.
관련기사
- 미디어 위기와 '절대반지'의 유혹2015.12.24
- 평평해진 IT 뉴스 시장 헤쳐나갈 지혜2015.12.24
- 신문 닮은 애플 뉴스…매일 톱뉴스 편집2015.12.24
- 페북 뉴스 확대…불참 언론사 차별 없었나?2015.12.24
하여 이런 바램을 적어 본다. 내년엔 좀 더 인간의 감정이 살아 있는 기사를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로봇과 알고리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가치를 지닐 수 있는 글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고.
김현준과 이상민이 ‘전자 슈팅’과 ‘컴퓨터 어시스트’ 너머에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한 세대를 풍미했듯, 거대한 알고리즘 너머에 있는 세상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을묘년을 보내고 병신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나이든 기자’의 소박한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