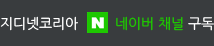디지털 저널리즘계의 ‘제다이’가 돌아온다. 지난 해 7월 제국을 떠난 지 6개월 만이다.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제다이가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돌아오는 IT 저널리즘 계의 제다이는 조수아 토폴스키다. 지난 해 7월 몸 담은지 불과 1년 만에 블룸버그를 떠났던 토폴스키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자금 마련에 착수했다고 리코드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폴스키는 ‘인디펜던트 미디어’란 지주 회사를 토대로 한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토폴스키는 또 비즈니스 뿐 아니라 정치, 문화 뉴스까지 다루는 사이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11년 4월 엔가젯 떠나면서 관심 집중
2011년 4월 3일. 뉴욕타임스는 엔가젯의 상징인 조수아 토플스키가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토폴스키를 비롯해 8명의 기자들이 엔가젯과 결별을 고했다.
한 때 대표적인 IT 뉴스 사이트로 꼽혔던 엔가젯은 그 무렵 AOL에 인수됐다. 거대 기업인 AOL은 엔가젯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엔가젯 소속 기자들은 이를 ‘편집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결국 이들은 ‘제다이’의 인도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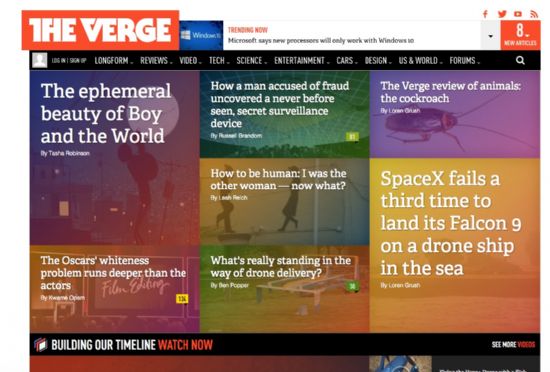
그리고 7개월 뒤인 그해 11월. 토폴스키는 ‘더버지(The Verge)’란 생소한 이름의 사이트를 들고 나왔다. AOL의 영향권을 벗어난 토폴스키가 선택한 우산은 스타트업의 정신이 살아 있던 복스였다.
더버지는 출범과 동시에 IT 저널리즘계의 강자로 떠올랐다. 3개월 만에 월간 순방문자 650만 명을 돌파한 것. ‘복스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이란 ‘광선검’을 손에 넣은 ‘제다이’ 토폴스키는 최고 수준의 내공을 맘껏 내보였다.
더버지가 무서운 강자로 떠오를 무렵 ‘IT 저널리즘’ 행성계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토폴스키가 무공을 맘껏 과시하던 2012년 무렵 월스트리트저널의 실력자 케빈 딜라니도 혈혈단신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왕국에서 뛰쳐나왔다.
딜라니는 2012년 애플랜틱과 손을 잡고 쿼츠(Quartz)란 경제-IT 전문 사이트를 만들었다. 쿼츠 역시 단기간에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강자로 떠올랐다.
■ 2014년 블룸버그로 깜짝 이적…1년만에 결별
더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13년 말이었다. IT 저널리즘계의 대사제(high priests)’로 통하던 월터 모스버그가 오랜 파트너인 월스트리트저널과 결별한 것이다. 모스버그가 월스트리트저널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던 올싱스디지털은 깊이 있는 분석과 탁월한 제품 리뷰로 마니아층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매체였다.
하지만 모스버그 역시 2014년 NBC유니버셜의 투자를 받고 리코드란 새로운 뉴스 사이트를 개설했다. 리코드엔 모스버그의 단짝인 카라 스위셔도 함께 합류했다.
리코드의 가세로 ‘IT 저널리즘 행성’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던 2014년 7월 깜짝 발표가 나왔다. 토폴스키가 자신의 왕국인 더버지를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더 놀라운 건 토폴스키가 이번엔 ‘모험’ 대신 안정된 곳을 택했다는 점이었다. 그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블룸버그였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토폴스키가 맘껏 능력을 발휘할만한 곳은 못 됐다. 꽉 짜여진 조직에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뉴욕 시장 임기를 끝낸 사주 마이클 블룸버그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토폴스키는 이듬 해인 2015년 1월말 첫 작품을 내놨다. 바로 ‘사이트 리뉴얼’이었다. 기존 통신사 사이트와는 기본 콘셉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디자인. 그러다보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기존 관행에 익숙했던 조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사주인 마이클 블룸버그였다. 혁신과 새로운 실험에 관심이 많은 토풀스키와 달리 마이클 블룸버그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인물’이었다. 그는 사진을 비롯한 이미지를 강조한 ‘토폴스키표 디자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경영 복귀 후 첫 영입한 인재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잔뼈가 굵은 존 미클스웨이트였다. 2014년 12월 뉴스 쪽 책임자로 영입된 미클스웨이트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이 경영자로 있을 당시 해왔던 뉴스 전략을 다시 밀어부치겠다는 신호탄이나 다름 없었다.
■ "모노클 닮은 명품 뉴스 매체 만들겠다"
토폴스키가 블룸버그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더버지도 ‘토폴스키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국 더버지 모회사인 복스는 2015년 5월 ‘IT 저널리즘 행성계의 대사제’ 월터 모스버그가 이끌고 있던 리코드를 전격 인수하면서 전력을 재정비했다.
더버지와 리코드 간의 합병이 발표된 지 2개월 뒤인 2015년 7월. 마침내 조수아 토폴스키도 블룸버그와 짧았던 만남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수아 토폴스키가 블룸버그에 합류하던 무렵부터 1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IT 저널리즘 행성계엔 여러 일들이 벌어졌다. 고품격 사이트로 명성을 떨치던 기가옴이 사업을 접은 데 이어 애널리스트 출신 헨리 블로짓이 이끌던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어 손에 들어갔다.
지난 해 7월 블룸버그를 그만둔 조수아 토폴스키가 6개월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IT 뉴스 쪽은 아니다.

토폴스키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영국 명품 잡지 '모노클'과 비슷한 유형이다. 정치, 문화 영역까지 망라하는 명품 뉴스 매체를 통해 주머니 두둑한 독자들의 시선을 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폴스키는 500만~1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크 앤드리센을 비롯한 IT 투자 거물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리코드에 따르면 토풀스키는 버즈피드 편집 책임자인 샤니 힐턴과 케이티 드럼몬드 등에게도 손을 뻗쳤다. 하지만 이들은 토폴스키의 새로운 뉴스 비즈니스에 합류하길 거절했다고 리코드가 전했다.
관련기사
- 백기 든 페북 창업자…'뉴스룸'의 처참한 실패2016.01.18
- '카카오 억대 연봉' 해프닝과 전자 슈터2016.01.18
- 미디어 위기와 '절대반지'의 유혹2016.01.18
- 美 경제사이트 인기…쿼츠도 팔리나2016.01.18
조수아 토폴스키는 최근 5년 동안 한번의 성공과 한번의 실패를 맛봤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인 블룸버그에서의 처참한 실패는 ‘IT뉴스의 제다이’ 토폴스키에겐 좋은 경험이 됐을 게 분명하다.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를 꿈꾸는 조수아 토폴스키.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제 막 투자 유치 중인 한 미디어 전문가의 행보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다소 과해보일 순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토폴스키라면 그 정도 관심을 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