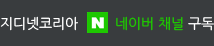페이스북이 ‘뉴스 조작’ 공방에 휘말렸다. 좋아할만한 뉴스를 골라주는 ‘트렌딩’ 섹션에서 보수적인 뉴스를 고의로 제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즉각 “근거 없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잦은 알고리즘 변경’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칫하면 이번 공방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인위적 뉴스 배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였다. 기즈모도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익명의 페이스북 뉴스 편집자 출신을 인용해 “밋 롬니, 랜드 폴 등 공화당 정치인 관련 뉴스를 삭제해 왔다”고 보도했다.

■ 미국 상원 "뉴스 조작 공방 해명하라" 압박
그 뿐 아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과 관련된 불리한 뉴스 역시 인위적으로 제거해 왔다고 기즈모도가 전했다. 기즈모도 측은 자신들과 인터뷰한 사람은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12월까지 페이스북 뉴스 큐레이터로 재직했다고 공개했다.
물론 페이스북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의 뉴스 큐레이터 책임자인 톰 스타키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치적 관점을 억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뉴스 조작’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미국 상원까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씨넷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상원 의원은 10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페이스북이 보수적인 이슈를 트렌딩 토픽에 표출되는 것을 억제해 왔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존 튠 의원은 미국 상원 통상위원장이다.
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은 심각한 주장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뉴스를 배포할 때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정치적 주장을 검열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신뢰 남용일 뿐 아니라 오픈 인터넷의 가치와도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은 페이스북 측에 오는 24일까지 존 튠 의원 질의에 대해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 트렌딩 토픽, 2014년 도입…인기 기사 큐레이션
이번에 논란이 된 트렌딩 토픽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처음 도입한 것이다. 데스크톱과 모바일에 동시 적용된 트렌딩 토픽은 이용자들의 토론 등을 토대로 인기 있는 뉴스를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다.
PC 이용자들에겐 뉴스피드 오른쪽에 ‘트렌딩’이란 박스와 함께 표출된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앱 상단 검색 창을 눌러야만 트렌딩 토픽을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이 편집자가 관여하는 ‘트렌딩 토픽’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뉴스피드 알고리즘 편향성 공방은 끊임 없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한 차례 이상 뉴스피드 표출 알고리즘을 수정해 왔다. 그리고 그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나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페이스북 알고리즘 변화에 따라 유입 방문자 수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바꾼 것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스턴트 아티클을 비롯한 자사 서비스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는 건 현재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즈모도 보도가 나간 뒤 미국 보수층들은 페이스북을 집중 비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의 절묘한 알고리즘 변경2016.05.11
- 페이스북, 네이티브 광고 대폭 허용2016.05.11
-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2016.05.11
- '모바일+동영상' 페이스북 질주 이끌었다2016.05.11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파 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의 레온 울프 편집장은 “기즈모도가 보도한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 트렌딩 토픽에서 뉴스를 선정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미스테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