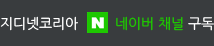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액수를 넘어가면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그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어지간한 규모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사실은 보통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국내 기업가라면 구글 아마존 등의 연구개발(R&D) 규모를 보고 입만 딱 벌릴 뿐, 누군가 그 돈을 진짜로 투자한다고 해도, 그에 맞는 그림을 구상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조(兆) 단위 투자는 심심찮게 보인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매년 수조원에서 십 수 조 원을 투자한다. 다른 대기업도 적잖은 투자를 한다. 그런데 국내 기업의 투자는 대개 눈에 보인다. 대부분 시설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늘리거나 시설을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교체할 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은 대부분 설비와 시설이 중요한 업종에 속한다.

국내 투자 가운데 단연 눈에 뛰었던 건 쿠팡에 대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투자였다. 조(兆) 단위 투자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진행됐다. 쿠팡의 경우 지금은 볼륨을 엄청 키웠지만 당시만 하여도 IT에 기반한 유통 분야의 스타트업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 했다. 과연 저렇게 투자하고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들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문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 봐야 한다.
쿠팡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점차 알게 됐다. 신생 업체가 유통 인프라(물류센터 및 배달시스템)를 경쟁사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데는 당연히 대규모 자금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말이다. 쿠팡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물류와 배달의 혁신이자 고급화다. 플랫폼 중심이던 과거 온라인 유통업체 전략과 다르다. 시설과 인력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승부가 갈리는 싸움을 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제조업 투자방식에 익숙하다. 서비스 업종이라 하더라도 내수가 이미 존재하고 시설에 투자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투자에 익숙하다. 다른 말로 하면 투입과 산출이 비교적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투자에 익숙하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경험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내수도 작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기업문화 배경이자 뿌리다.
벤처투자라는 말이 국내에 들어온 지 이미 30년은 족히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모험자본’은 국내에 없었다. 다만 철저하게 수학적인 투자자금만이 존재했다. 벤처 1세대로서 메디슨과 네이버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기인한다. 성공한 벤처 1세대를 꼽아보라. 모두 내수 업종이다. 설사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메디슨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험자본’이 없는 국내에서는 사실 성공하기 힘든 모델이었다. 내수로만 살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모험자본’ 없이는 글로벌 경쟁자와 맞설 수 없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는커녕, 어느 시점이 되면 내수 시장마저 내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그렇게 쓰러진 국내 제조기반 벤처기업만 따져도 책 수십권을 쓸 수 있을 지경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제 제조 분야 벤처의 과거사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지난 20여 년 간 분투한 덕에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업체에 맞서 내수 시장만은 탄탄하게 지켜냈던 국내 인터넷 업계도 한계에 온 듯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내 몇몇 서비스는 잘 나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업체에 대한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사례에서 보듯 동영상 서비스의 패권은 이미 미국 기업에 넘어갔고, 모바일 분야 또한 운용체계를 석권하고 있는 구글과 상대하기 벅차다.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게임 서비스도 이미 중국을 이기기 힘들 정도다. 입장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넥슨을 매각하려 했던 것 또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모두에게 엄중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결단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는 싸움판에 낄 수도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회오리 판에서는 시가총액 30조원으로 국내 4위인 기업 또한 작은 돛단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 기업일망정 누군가와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게 한 거다.
관련기사
- AI와 싸우는 노동자와 AI를 부리는 사용자2019.11.18
- 日 손정의와 韓 이해진이 손잡은 이유2019.11.18
- ‘누구’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KT 새 회장 선임2019.11.18
- 삼성 스마트폰에 다시 찾아온 기회2019.11.18
네이버(라인)와 소프트뱅크(야후) 한일 두 인터넷 기업이 합자회사를 설립하면 매년 AI 등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한다. 이 투자는 비록 한일 합자회사지만 한국계 기업이 처음으로 대하는 대형 모험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구글이나 중국의 거대 회사에 비하면 적겠지만 시설 아닌 기술에 대한 비전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고 한국 경제사의 새로운 이정표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 사례를 잘 지켜보고, 성공 여부를 떠나, 시도 자체를 벤치마킹하려 해야 새 길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