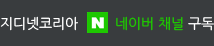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잃어버린 성궤 찾기’란 영문학의 모티브가 잘 녹아있는 작품이다. <반지의 제왕>에선 절대반지(the One Ring)’가 성궤 역할을 한다.
절대반지. 손에 넣기만 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영물. 하지만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은 오히려 그 반지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반지의 제왕>은 주인공 프로도와 간달프가 주도하는 반지원정대가 절대반지를 없애버리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이 많이 어렵다. 미국 등에선 올 한해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매각됐다. 올 초 ‘깊이 있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가옴이 파산한 것이 신호탄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큐레이션 앱인 서카도 사업을 접었으며,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기업 니케이에 매각됐다.
콘텐츠 경쟁력 면에선 누구에게도 지지않는다고 자부했던 리코드 역시 복스 품에 안겼다. 리코드는 또 다른 IT 매체인 더버지와 '한 지붕 두 가족'이 왰다.
급기야 ‘블로고스피어의 브래드 피트’로 통하는 피터 캐시모어가 이끄는 매셔블까지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 매셔블은 차별화된 IT 콘텐츠로 한 때는 CNN의 구애를 거절했을 정도로 잘 나가던 매체였다.

■ 무지개 빛 절대반지의 허상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좀 더 암울하다. 물론 미국처럼 갑작스럽게 도산하는 미디어는 별로 없다. 하지만 좁은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상황은 더 힘들다.
그러다보니 지난 해의 화두가 ‘혁신’이었다면 올해는 ‘생존’이 최대 과제란 말까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뭔가 획기적인 비법이 없겠냐는 넋두리를 자주 듣는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넌 나름 미디어 전문가 아니냐? 세계 시장 흐름도 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해법을 한번 탐구할 수 있지 않겠냐?”
우스개 소리일망정, 그런 질문을 접할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 일차적인 이유는 그런 절대 반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더 큰 당혹감은 따로 있다. 현재 미디어 기업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절대반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미디어들도 고만고만한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고민과 성찰의 깊이에 따라 해법의 수준이 다르긴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암흑 같은 시장을 단번에 돌파해줄 마법의 절대반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무 암울한가? 그렇다면 잠시 판타지 세계 속으로 들어가보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만약 미디어 시장의 각종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줄 절대반지를 손에 넣었다면? 그래서 그 반지를 앞세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와 가까운 몇몇 기업들만 알토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질 못하겠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할 뿐더러, '정보 확산과 공유'란 21세기 철학에도 잘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 느리지만 꾸준한 일상적 실천이 절대반지 아닐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보자. 난 위기를 단번에 해결해 줄 절대반지를 기대하는 건 '무지개'를 좇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허상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지금 미디어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없는 절대반지’에 눈이 멀게 되면 현실 속 사소한 것들은 좀체 성이 차지 않게 마련이다.
그래서 미디어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긴 호흡, 강한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나가려는 인내심도 요구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현실 속에서 하나 하나 부닥쳐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넋두리 같은 글을 맺으려니 시 한 편이 귓가에서 아른거린다. 헤밍웨이 소설 때문에 유명해진 존 던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마지막 구절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니.”
관련기사
- 평평해진 IT 뉴스 시장 헤쳐나갈 지혜2015.12.22
- '월가 악동'서 미디어 재벌로…헨리 블로짓 '화제'2015.12.22
- 페북-애플-구글은 왜 뉴스에 군침 흘릴까2015.12.22
- NYT, '유료 독자 100만'의 어두운 그림자2015.12.22
이 싯구절을 요렇게 살짝 비틀어보면 어떨까?
“그러니, 존재하지도 않는 절대반지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절대반지는 그대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