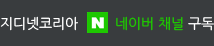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80개국 중 43위입니다. 얼핏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일본(67위)과 미국(45위)보다 높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요. 이 수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6년으로 31위였습니다. 진보 정권 때가 보수 정권 시절보다 언론 자유도가 높은 거죠.
이 기준에는 아마 포털 댓글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중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포털이라는 게 구글을 의미하고 그건 거의 다 비슷하다는 뜻이죠.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준에 포털을 넣으면 우리 언론 자유도는 크게 높아질 겁니다. 포털 댓글을 통해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죠.
언론의 자유도가 높다는 건 권력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일 겁니다. 한때 우리도 권력의 살벌한 감시 탓에 입을 틀어막고 살아야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할 말을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의 무한대의 광장(廣場)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판이 권력을 포위하고 있지요. 종전을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남북이 적(敵)으로 대치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문제는 비판의 의도입니다. 비판은 ‘공생(共生)을 위한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배제한 비판은 그저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펼쳐진 광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상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상대를 죽이기 위한 피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猝富)가 좋게 돈 쓸 곳을 모르듯 급격히 커진 자유 때문에 말과 글의 쓰임을 모르는 셈이죠.
비판은 토론을 통해 서로 진심을 확인하며 조금씩 양보해 합의로 다가갑니다. 저주에는 토론도 양보도 합의도 없습니다. 오직 너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붉은 천만 보면 돌진하는 투우처럼 말이죠. 그 점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투우장인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전 별세한 최인훈 선생의 고민도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벌써 58년이나 지났는데, 이명준은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기업과 나라는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기업하기보다 나라하기가 백 배 천 배는 어렵습니다. 혁신(革新)하는 기업은 아주 많은데 좋은 나라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절대 군주제입니다. 오너나 대표의 생각을 거스른다는 건 거의 절대불가입니다. 그는 곧 왕(王)이자 황제(皇帝)이고 하늘입니다. 거스르려면 다른 땅을 찾아야 하죠.
기업 혁신은 보통 아는 것과 달리 참모나 직원이나 기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너나 대표만 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전(全) 재산을 건 자(者)들요. 오직 그만이 수만 가지 기로(岐路)에서 하나를 선택하지요. 참모나 직원이나 기술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자 중에서 눈이 밝아 최선을 선택한 오너나 대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그중에는 눈 밝은 기업가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나라는 기껏해야 2백 수 십 개입니다. 또 기업은 저주하는 자를 바로 내치면 그만인데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그래서 혁신보다 혁명(革命)을 합니다. 저주하는 자 몇 명 내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지요. 피를 안 보고는 저주를 잠재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혁명은 자주 미화되지만 결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피를 좋아하는 게 인간의 숙명일지는 모르지만 행복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의 잔을 수도 없이 들이키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유명한 말처럼 말이죠. 이 말은 꽤 일리가 있는 통찰입니다. 역사적인 시각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결과입니다. 혁명을 한 것과 민초가 행복한 것은 꼭 일치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라는 그래서 기업과 달리 빠른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기업은 무능한 자를 버리면 그만이지만 나라는 그들 다 보듬고 가야하기 때문이지요. 1960년대처럼 아주 가난하거나 폭군이 군림할 때는 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일사분란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OECD 10권 나라가 되고도 그래야 하는 지 진짜 모르겠네요. 아직 피가 더 필요한지.
관련기사
- 문 대통령은 왜 지지자를 배신할까2018.08.10
- 누가 정부와 기업을 자꾸 이간질 하나2018.08.10
- 한국 경제에 ‘장하준 해법’은 통할까요2018.08.10
- SK텔레콤, 또 카카오에 뒷덜미 잡히나2018.08.10
사반세기 동안 IT 기자를 한 이가 가끔 정치색 있는 칼럼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포털로 일부 대변되는 IT에는 사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철학이나 기술이나 다 존재하기도 하구요. 포털의 댓글 공간은 적어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깊고 광범위하게 자유와 민주가 무한으로 주어진 무대입니다. 공기나 물처럼 말이죠. 아테네의 아고라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소중하게 쓰십시다. 저주보다 공생을 위한 비판 공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