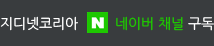바야흐로 '대 사투리' 시대다. 정치인들의 모호한 화법인 '여의도 사투리', 법조인 특유의 화법인 '서초동 사투리'가 그렇다. 기자가 취재하는 IT 업계도 고유의 사투리가 존재한다. 이른바 '판교 사투리'다.
예컨대 "내일까지 이번 이슈(issue) 디밸롭(Develop)해서 사전 컨펌(confirm)받고 저한테 메일 샌드(send) 해주세요"와 같은 식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지적 고상함을 표현한다.
IT업계 간담회라도 가는 날이면 머리가 아파온다. 그레이존(Gray zone)이 어떻고 데모데이(Demo day)가 어떻고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어떻고 발표의 7,80%가 불필요한 영어다. 500년전 돌아가신 세종대왕은 이 세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말의 맛'이 있는 건 동의한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영어 표현들은 얼마든지 한국어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들은 자신의 '스마트'함을 뽐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기엔 '엣지'도 없고 '스마트'함도 없다.
더욱이 IT업계의 불필요한 영어 남발 배경엔 영어에 대한 맹목적인 숭앙, 사대주의도 숨어있다. '갭차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가 파생된 것 역시 이런 이면에 기인한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런 업계의 관행이 더 슬프게 다가온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 '신용 사면'이라는 포퓰리즘 뒤2024.01.22
- [기자수첩] 취임 석달만에 옷 벗는 방문규...3개월 인턴 장관이었나?2023.12.19
- [기자수첩] 건보공단, 생보사에 건강정보 제공 못하나, 안하나2023.12.07
- [기자수첩] 제 잘못 덮으려는 트위치 CEO2023.12.06
앞서 법조계는 판결문 쉽게쓰기 운동을 시행한 바 있다. '소훼하다'를 불에 탔다로 '금원'을 돈으로 대체해 표현하는 등 일반인들과는 괴리되는 법조 언어를 친숙하게 바꾸려는 노력이었다. 언론 사례 역시 좋다. 기자들은 처음 입사해 교육 받을 때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준으로 글을 쓰라고 배운다.
쉬운 문장, 간결한 언어 사용을 강박적으로 교육한다. IT 업계는 이같은 사례를 곱씹어 보길 요청드린다. 불통은 결국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국가 전반에 뿌리 내린 IT를 자신들의 언어로만 향유하지 않기를 강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