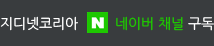한 달 가량 계속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회 기능들이 스톱됐다. 원격(재택) 근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거리도 썰렁하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대부분 대학들은 개학을 미뤘다. 이달말까지 온라인 강좌로 대신하는 곳이 많다. ‘온라인 강의 촬영’ 때문에 교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주 들어선 미국 대학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대학 등이 대부분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탠퍼드, UC버클리 등 서부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비상 상황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간 다시 대면강의가 시작될 것이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 때가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된 온라인 강의는 자연스럽게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 어차피 대면 강의를 할 텐데, 굳이 온라인 강의를 또 할 필요는 없을 테니.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원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게 과연 최선일까?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교육시스템에 대해 돌아볼 계기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 모바일 시대의 대학교육, 20세기와는 달라저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자.
내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 대학 수업의 기본은 필기였다. 교수 강의를 잘 받아적는 게 중요했다. 교과 과정도 수 십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교수들의 낡은 강의 노트는 ‘게으름의 표식’이 아니라 ‘연륜의 상징’으로 통했다.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다. 교수들이 첨단 지식의 유일한 전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졸업정원제 덕분에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늘어난 탓에 ‘일방적 전달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를 든 교수가 대형 강의실에서 혼자 떠드는 게 효율성 면에선 나쁘지 않았다.
그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조금만 검색하면 최신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식을 공유할 온라인/디지털 플랫폼도 널려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크게 줄었다. 획기적인 교육 방법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증발’을 통해 모바일 경제가 몰고 올 변화를 진단했던 로버트 터섹은 “대학도 증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처럼 대형 건물과 강의실을 중심으로 한 고비용 구조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특히 ‘교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부분을 직접 옮겨보자.

“정보 전달은 기계나 미디어가 더 훌륭하게 수행한다. 인간 교사는 질문하는 방법, 사리에 맞게 토론하는 방법,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 비판하는방법을 더 잘 가르친다. 교사는 강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방대한 정보 흐름을 헤치고 다니면서 유용한 정보원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을 어떻게 구분할 지 알려줄 수 있다. 일방향 강의는 줄고 대화, 도전, 토론이 늘어날 것이다.” (증발, 264쪽)
터섹의 주장에 100% 공감한다. 물론 지금도 많은 대학 교수들이 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 시스템이다. 모바일 경제 시대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사고력과 통찰력 함양’이 기본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온라인 강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선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해준다. 대신 대면 수업에선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사고력과 비판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물론 교수들의 강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 부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비싼 수업료를 감안하면 그 정도 서비스는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 졸업장이 주는 혜택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
11세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 꼽힌다. 그 무렵 대학들은 시설과 장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건물 없이 성당 같은 곳을 빌려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훌륭한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한 조합 형태였다. 강의의 품질이 대학 서열과 직결됐다.

지금의 대학은 조금 다르다. 강의의 품질과 대학 서열이 일치한다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졸업장이 주는 매력이 대학 서열을 결정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확률을 높여주는 보증수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대학 사회가 ‘강의’와 ‘교수진’만으로 서열이 결정되는 구조가 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졸업장이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사태' 보도하는 어느 기자의 비망록2020.03.10
- 일주일 원격 근무해보니…"일과 생활 경계 무너졌다"2020.03.06
- "코로나 얘길 왜 나한테 묻나?"…어느 축구감독의 감동 인터뷰2020.03.05
- 카뮈 소설 '페스트'를 통해 본 코로나19 사태2020.03.03
하지만 사회가 좀 더 세분화, 전문화될 경우 ‘졸업장 중심의 명문대 기득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온라인 강의 경험’을 통해 대학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