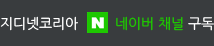11일 국회 권은희 의원이 주최한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두 분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일곱 분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국가적 재난, 멈춰선 대국민 서비스’라는 부제가 암시하는 만큼 토론의 소재는 엄중했고 주제 발표나 토론 모두 시종 진지했다. 두 시간의 짧은 토론이었지만 짚을 것은 웬만큼 짚은 듯도 했다.
토론이 끝나고 돌아서는 발길은, 그러나, 가볍지 않았다. 의사는 아니지만 합병증으로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를 두고 대책 없이 돌아서는 의사의 마음이 그럴까 싶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짚어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모두 그럴 듯했지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저출산 문제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해결의 희망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은 비슷해보였다.

토론 발언 중 여전히 귓전을 맴도는 두 마디가 있다. 하나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4건의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앞으로 이런 장애가 더 자주 더 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경고가 믿을 만 하다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구축된 수십 만 개의 시스템은 행정업무와 국민 편의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언제든 국민을 괴롭힐 괴물이기도 한 것이다.
토론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말도 비수처럼 다가왔다. 충분히 공감됐다. 주제 발표를 한 분이나 토론에 참여한 분들 모두 이 문제에 십 수 년 째 매달려온 전문가들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였고 토론했으며 원인과 처방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깊어졌다. 그러니 앵무새처럼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무슨 희망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발언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엄살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해보면 전문가들마저 역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 문제의 실마리는 거기서 찾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이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실은 진단과 처방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파편적인 소수의 전문가가 이 중병을 치료할 의사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정보시스템은 불행한 사생아의 처지와 같다. 보호를 받기는커녕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했다. 그런 상태로 긴 시간이 흘러 영양실조에 합병증까지 걸렸지만 누가 이를 치료할 의사이고 누가 치료받을 환자인지도 모른다.
국가정보시스템이 불행한 사생아의 운명이 된 까닭은 불협화음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발주자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곳과 시스템을 구축할 실무 부처, 그리고 기술을 지원하고 제도를 만드는 부처가 각기 다르다. 수십 만 개의 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자들은 때가 되면 바뀐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를 알기 어렵고 굳이 밝히려 한다하더라도 그게 온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곳은 민간기업이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다. 하지만 늘 예산은 빡빡하다. 때론 적자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최소한의 면피만 하려 할 수도 있다. 수십 만 개의 시스템이 이런 불협화음 속에 만들어졌고 근근이 버티어온 거다.
관련기사
- 흘러내리는 태극기와 9급 공무원의 보수2023.12.07
- 김정호의 ‘카카오 수술’이 성공했으면 한다2023.11.29
- 행정망을 뿌리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2023.11.23
- 오픈AI 이사회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2023.11.21
토론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나왔다. 그들 대부분 국가정보시스템의 일부에 관여했던 당사자인데 피해자처럼 느껴졌다. 어떤 발언은 울분에 차 있기도 했다. 국가정보시스템이 불행한 사생아인 탓인지 발주자든 사업자든 억울해보였다. 일선 현장에선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게 무색하게도 시스템은 누더기처럼 낡은 상태가 됐다.
그 역설의 돌파구가 안 보여 마음이 무거웠다. ‘민관 협력’이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 말 또한 공허해보였다. 뚜렷한 비전을 세워 시스템의 모든 과정에 상존하는 불협화음을 깨고 수십 만 개에 달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터인데 그 치료를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진단은 쉬워도 치료는 어려운 게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이다.